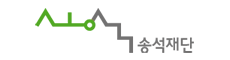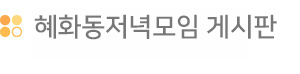
혜화동저녁모임_2022년 11월_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 KakaoTalk_20221116_152435361_031.jpg [File Size:1.50MB]
- KakaoTalk_20221116_152435361_0811.jpg [File Size:1.66MB]
2022 혜화동 저녁모임
| 일시: 11월 14일(월) 저녁 7시 – 9시
| 주제: 공존을 위한 교양 –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 강연: 현병호 | 격월간 「민들레」 발행인
11월 혜화동저녁모임은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 저자 현병호 선생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표준화되고, 형식화된 교육을 벗어난 배움의 장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대안교육에 한번 쯤 눈을 돌려 봤을 것입니다. 어쩌면 대안교육은 제도화된 교육의 틀을 넘어서 '다른' 교육의 가능성을 꿈꾸는 '반작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대안교육의 장에서도 의문을 갖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표준화를 거부하는 개성, 형식을 등한시하는 내용 중심, 교육을 터부시하는 배움, 삶의 능력을 키우는 자급자립, 홈스쿨링에서부터 대안학교까지 지금도 '대안교육'의 현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졌을까요? 대안교육이 더 좋은 사람을 키워냈을까요? 그 대답을 하기엔 아직 섣부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듯이, 100년은 족히 지나봐야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차치하고, 정말 '대안'이 더 좋은 교육인지 묻는 일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현병호 선생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학교를 넘어서는 배움의 장을 꿈꾸며 대안교육잡지 「민들레」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현병호 선생은 제도화된 교육에 대해 반대하는 투사였습니다.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이라는 「민들레」의 제호답게,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오늘날 대안교육이 자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이런 교육의 목적에 근거한 것일 테지요. 그런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그 전에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스스로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며 "그때의 나는 어설펐다"고 고백합니다.

현병호 선생이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은 '상호작용'입니다. 학교는 배움의 장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장입니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한 데 모아놓고,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것만으로도 학교가 해야 하는 일은 다 한 셈입니다. 학교에서 '가슴 뛰는 삶'을 꿈꾸거나, 학교에서 '삶의 배움'을 꿈꾸는 것은 학교의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라 선택지에 불과합니다. 특히 오늘날 행정이 중심이 되는 학교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 역량의 문제도, 아이들의 문제도 아닙니다. 학교라는 제도 자체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한데 모아놓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학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곤란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상호작용의 총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족사회로부터 오늘날 세계화시대로까지 나아가면서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서로간의 얽힘이 복잡해졌습니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오래도록 지속해온 이유도 바로 상호작용의 총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얽힘이 복잡하다는 것은 바둑에서 돌과 돌 사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글자에서 하나의 획과 다른 획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상호작용이 긴밀하게 얽혀 비로소 완성되고, 단단해집니다.
교육은 그런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이들의 수발신 능력이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 대부분이 화장을 하고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학교에 파우더룸이 만들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화장은 지금 청소년들 사이의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현장의 수신자로서 아이들의 화장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알아채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는 일은 올바르지 않다'거나 '외적인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며 화장하는 아이들을 나무란다면 그건 잘못된 수신입니다. 아이들이 화장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가 세상에 어떻게 보이길 바라는 표현의 수단이며,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욕구입니다. 그렇게 수신한 자는 아이들이 세상과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고, 그 다양한 방법 중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게 교육할 것입니다. 현병호 선생이 말하는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이란 이런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상호작용을 해나감으로써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에너지를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현병호 선생이 꿈꾸는 교육이지 않을까요? 비로소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이 실현되지 않을까요? '함께'와 '혼자'가 대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함께 할 줄 아는 이가 혼자일 줄도 알고, 혼자일 줄 아는 이가 함께할 줄도 아는 것, 그것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현병호 선생님과의 대화를 끝으로 2022년 혜화동 저녁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으로 조심스럽게 진행되어 더 많은 분들을 초청하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겨울을 보내며 정성스럽게 다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혜화동 저녁모임을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